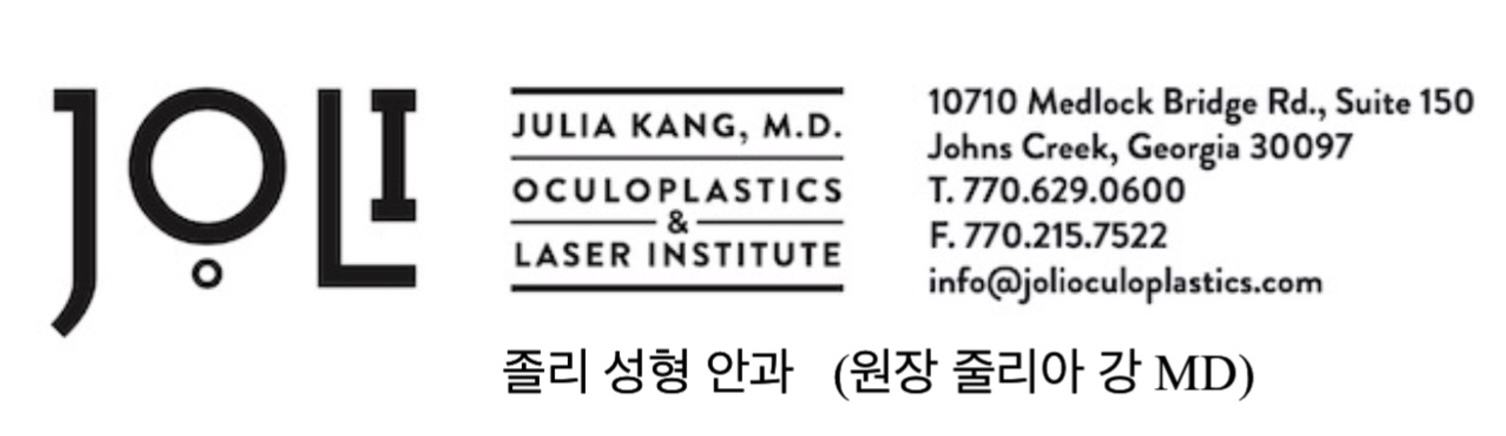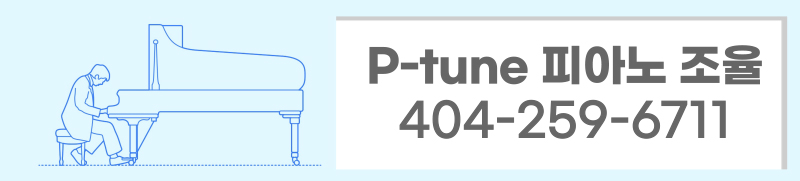이상운 시인
사람들에게 병원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안온한 집을 떠나 불편한 침대에 누워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밀폐된 작은 공간이 풍겨내는 정서적 스트레스도 있겠으나, 육체적 고통까지 더해지니 싫은 것이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한 압박도 큰 무게를 더할 것이다.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의 순간임에도, 평온한 표정을 하고 미소를 짓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즈음에 나는 ‘고통과 웃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고통과 웃음은 서로 정반대의 개념들이라서 공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립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정상일 터다.
어느 날 육십 대 후반의 여성 환자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8-9 of 10’이라고 했다. 장출혈과 건선 증세 등으로 고통이 심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밝은 얼굴로 웃음을 지었다. 나는, 힘들 텐데 어떻게 그리 긍정적인 표정과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자기는 심리학자이며 동기부여 강연자라고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재 환자의 수치를 고려하건대 그리 좋지 않았다. 흥미로운 차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녀의 관심 분야를 물었다. 그녀는 마음과 몸에 대한 이야기,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야기, 한국 침술에 대한 관심들을 내비쳤다. 듣는 중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왜 그녀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는지.
그런 가운데 그녀가 농담스러운 어조로 흥미로운 말을 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묘지 비석에 두 가지의 글을 적고 싶다고 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I told you, I was sick.’ ‘She died, but trying.’ 그녀는 비석의 앞쪽에 ‘내가 아팠다고 말했잖아요’에 적고, 묘비 뒤쪽에는 ‘그녀는 죽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전했다,’라고 적을 것이라 말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하루 동안 귀에서 매미 소리처럼 앵앵거리듯 맴돌았다. 만일, 나의 묘비에 어떤 문장을 남겨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적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묘비가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에 나의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아마도 어떤 이들은 기분 나쁘게 왜 그런 것을 생각해,라고 시답지 않게 여길 테지만. 자신의 인생을 깊게 사유한다는 면에서 참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어제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13명이 모여서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 관계가 참 예쁜 모습이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대략 보게 된다. 환자는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자 형제로서, 다양한 의미를 남은 자들에게 주고 떠났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많이 슬퍼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슬퍼하면서도 웃음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환자와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떠남에 대한 고통과 눈물이 여전했지만 눈물 위에 웃음도 함께 공존했다. 아마도 느끼는 고통과 슬픔보다, 함께 했던 아름다운 사랑, 신뢰, 추억이 더 커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다.
눈물과 함께 웃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은 경건하면서 고매한 순간이라 하겠다. ‘나의 아내가, 나의 엄마가, 나의 할머니가, 나의 동생이, 나의 이모가 되어 줘서 고맙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이 환자의 마지막을 숭고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반복적인 특정 패턴들 속에서 살아간다. 고통의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극한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부러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의연함과 평온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통과 미소가 공존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더 우세했다. 고통에게 끌려다니지 않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언어는 무척 긍정적이었다. 고통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 속 이었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를 뛰어 넘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공동체에게 감사를 아끼지 않는다.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나에게 배우자를 주어서, 자녀를 주어서, 친구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것이다.
고통과 웃음이 공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는다. 나를 자각하는 것은 이른바 고통이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이리라. 고통이 아름다운 나이테를 새겨가듯, 고통은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필요한 과정일 터이다. 만일 인간이 고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면, 예외가 없다면, 되레 고통을 잘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인생의 현명함이란 신기루 같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외려 고통의 순간에 의연함과 평화로움으로 잔잔한 웃음을 지으는 것이 아닐까?
[*이상운 시인은 가족치료 상담가로 활동하며,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날지 못한 새도 아름답다’가 있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