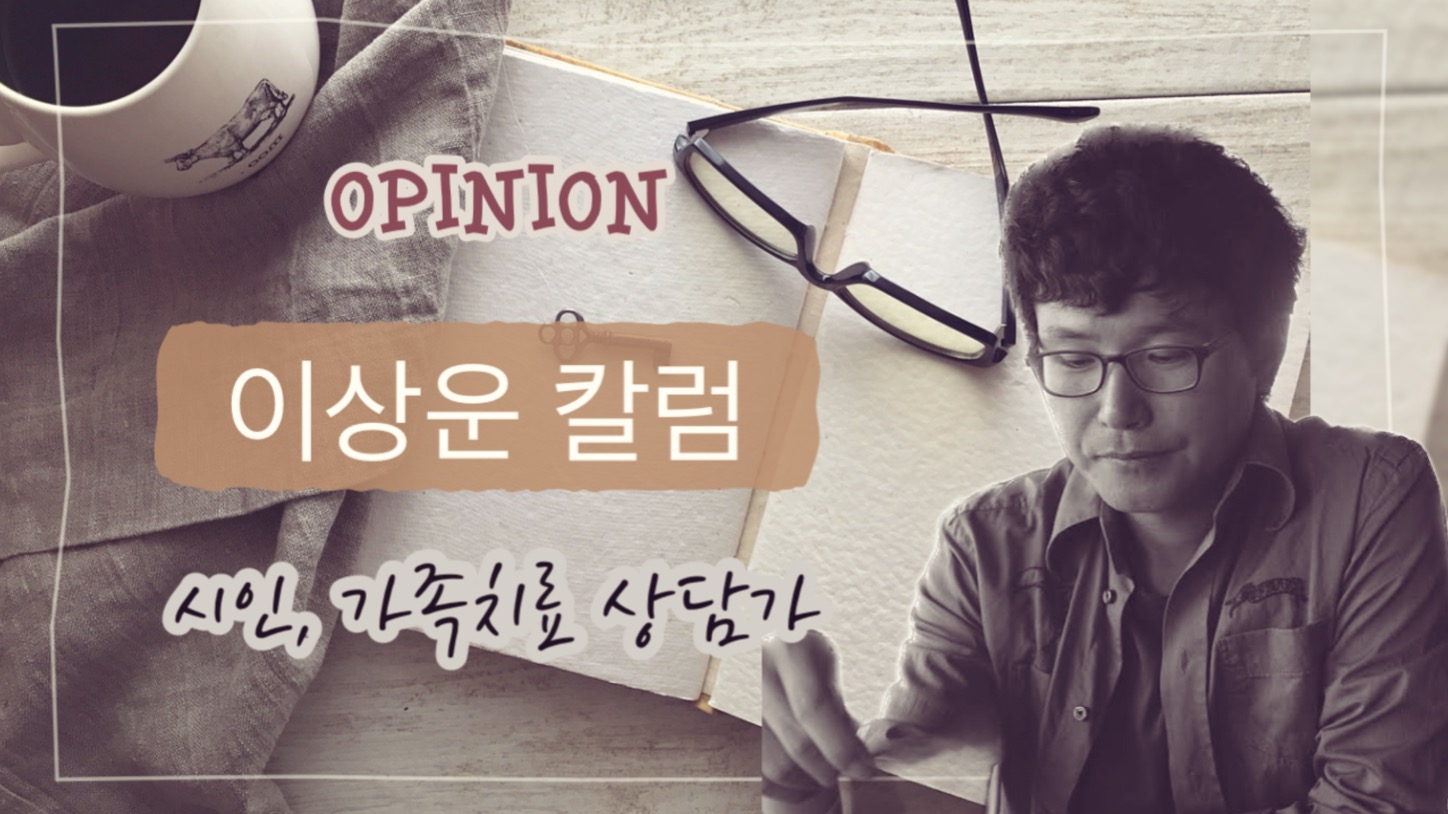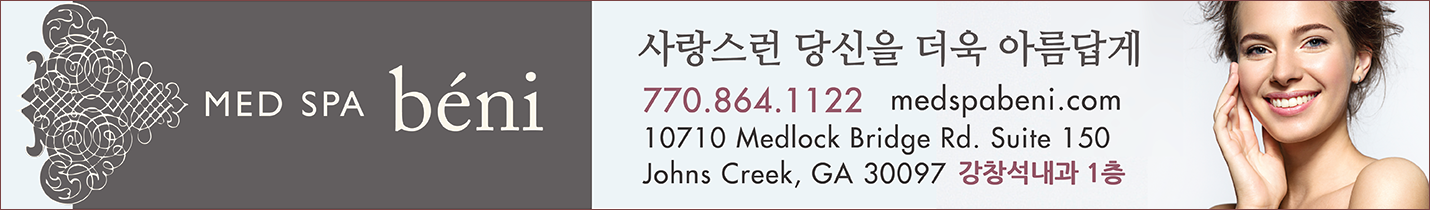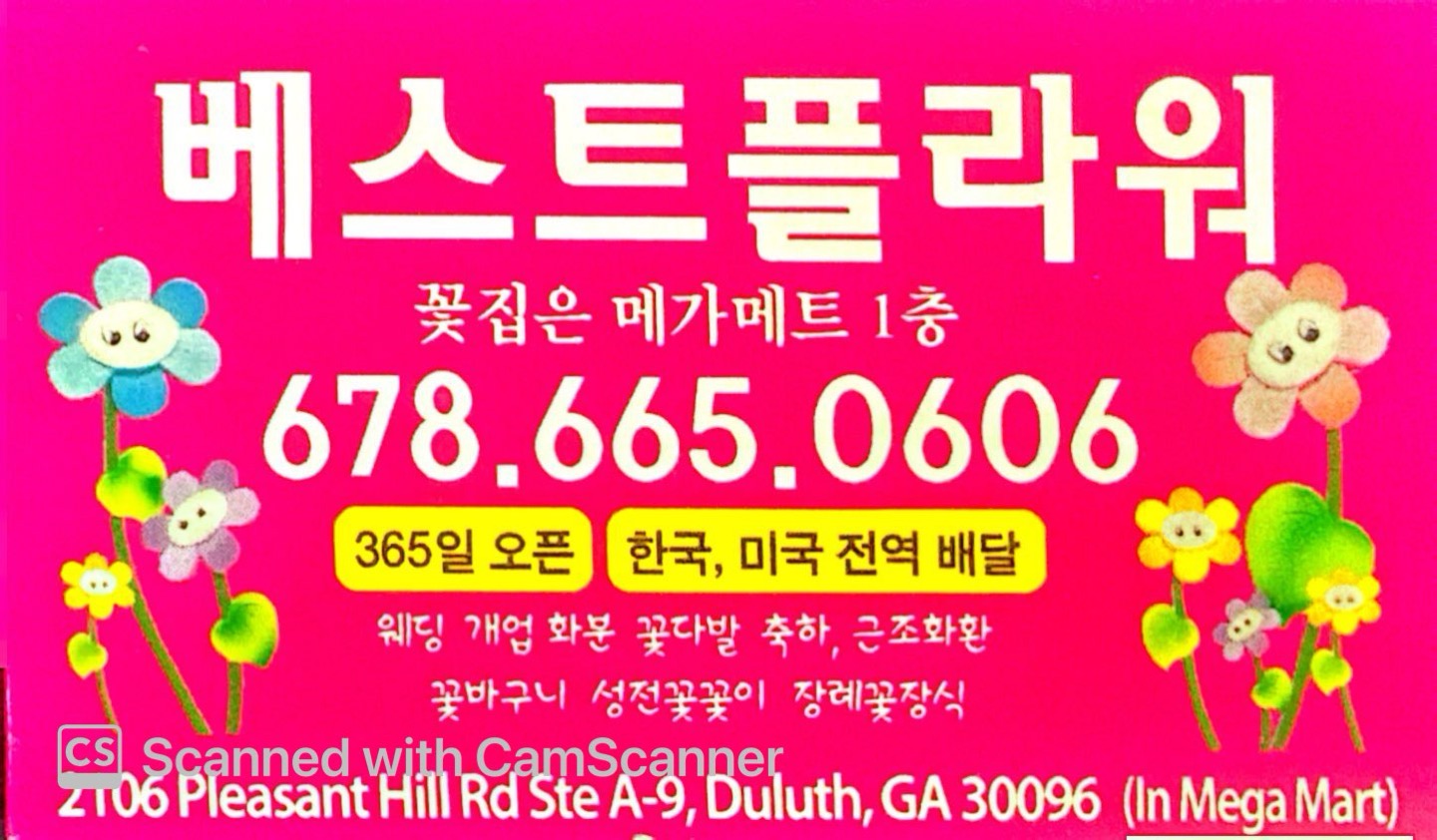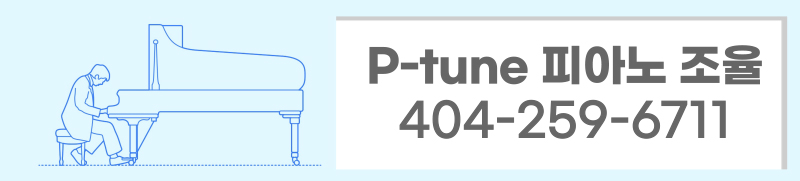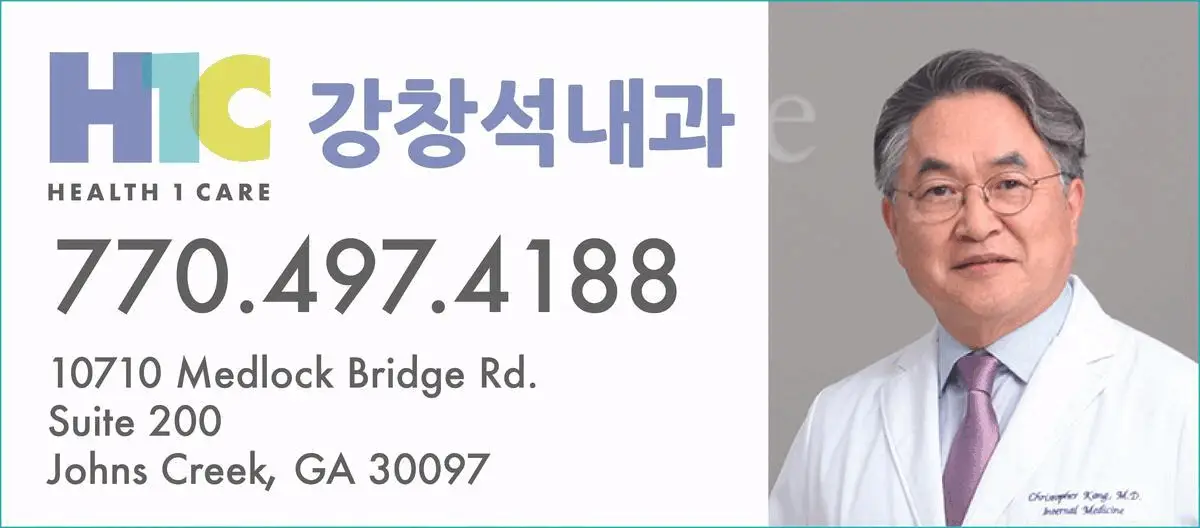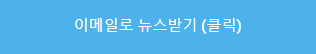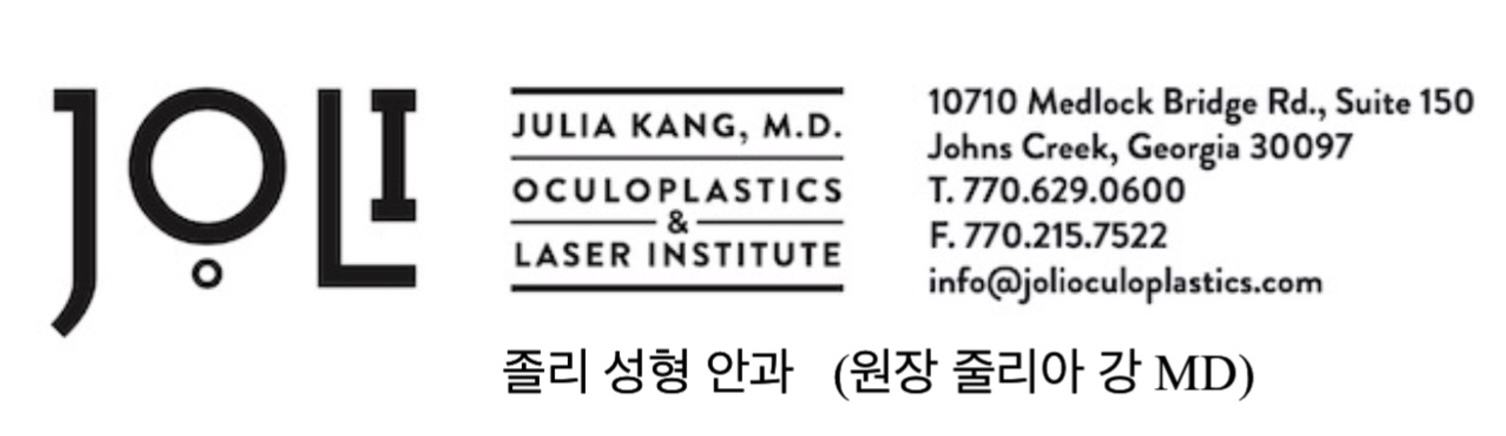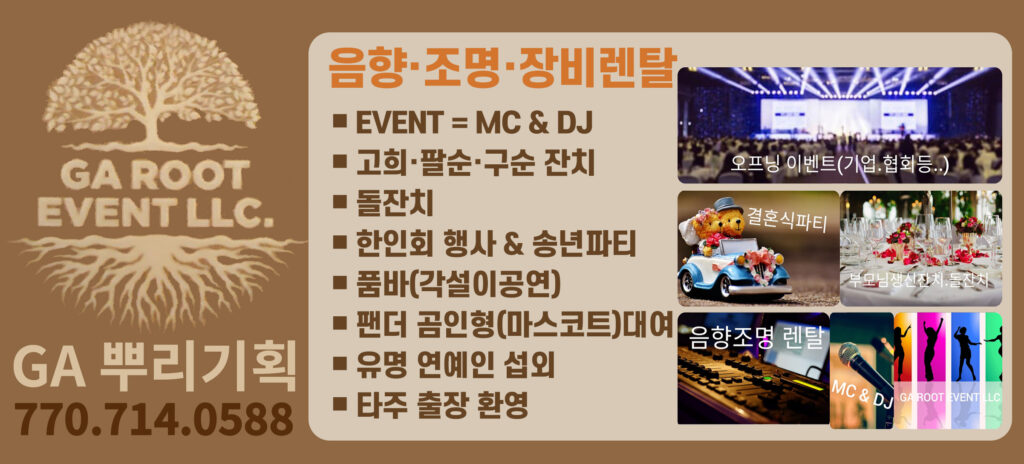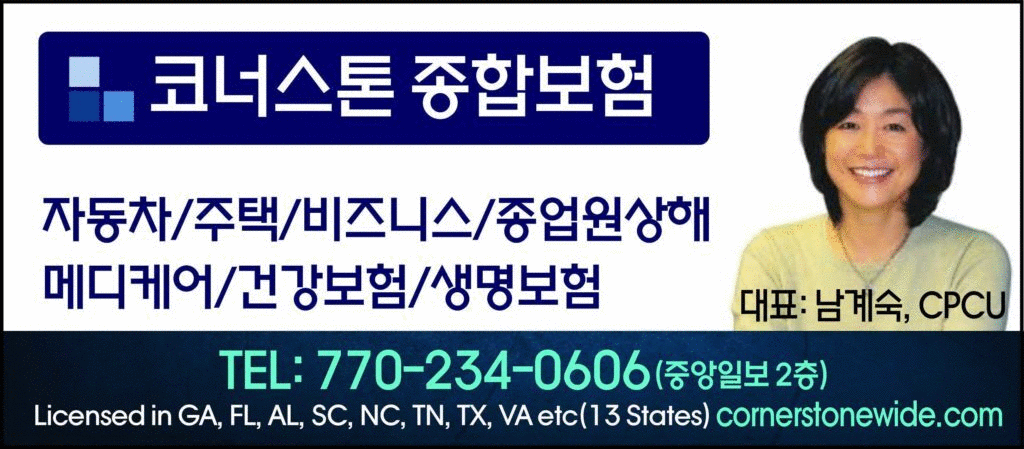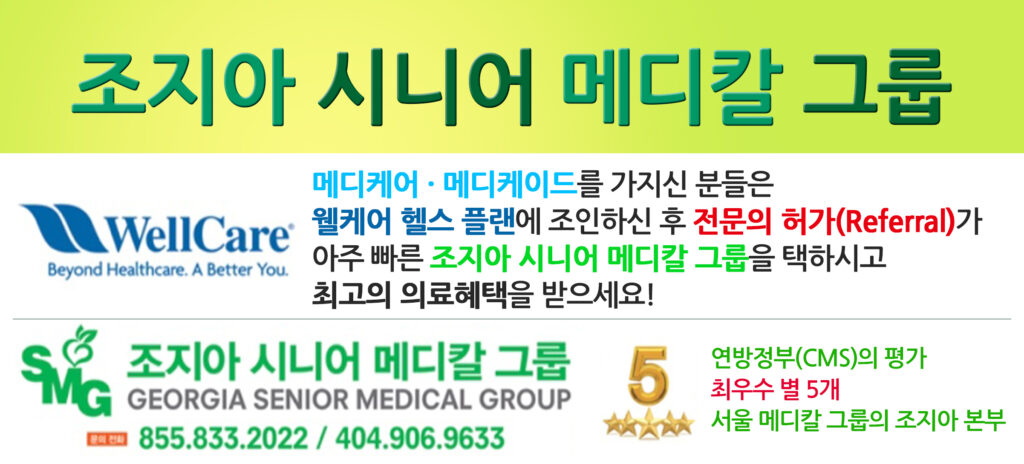집이 텅 빈 것처럼 적막이 흐른다. 마음도 장단을 맞추듯 울적해진다. 사랑하는 안해가 고국 방문을 했기 때문이다. 두 주 후면 상봉할 것을 알지만 못내 외로움을 숨길 수가 없다. 집이라는 물체의 부피에서 그녀의 질량을 빼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정서적인 면에서 집의 온도는 계절을 뛰어넘어 겨울이 된 듯하다. 일상에서 달라진 것은 그녀의 빈자리밖에는 없다. 그런데 매일 루틴처럼 해왔던 것들의 느낌, 분위기, 감정, 온도, 색깔, 소리 등이 사뭇 달라졌다. 예상과 달리 혼자라는 자유의 느낌은 오간데 없고 왠지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안해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느끼게 한다.
예전 선조들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난 후에 빈자리를 느낀다는 의미이다. 곁에 있을때 최선을 다해야 함을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번 파랑새를 찾아서 집 밖을 헤맨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 방황하는 삶을 산다. 파랑새는 자신의 집 처마에 있고, 집 앞 마당에 깔린 세잎 클로버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의 큰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어떤 것에 집중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경주마의 눈이 앞쪽만 보도록 옆을 가린 것처럼 말이다. 둘째, 사람은 뒤늦게 후회하며 산다. 어떤 일이 지난 후에 서글픈 후회가 밀려온다는 것이다. 버스는 떠났는데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생의 패턴이다. 이유는 너무 외적인 보이는 것을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파랑새와 행운도 놓치고 사람(가족, 친구)도 잃은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듣던 쉬운 말이지만, 오롯이 앞만 보며 뛸 때에는 이를 망각하고 산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물질과 외적인 것을 위해서 말이다.
오래전 안해가 몸이 아팠을 때 딸과 함께 쇼핑을 갔다. 좌충우돌하며 느낀 소회를 딸에게 시로 남겼다. ‘빈 껍데기’라는 제목의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함께라서 /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
엄마가 아파서 / 함께하지 못할 때 / 아빠는 깨달았다 / 빈 껍데기라는 것을
무엇 하나 / 반듯하게 해낼 수도 / 건넬 수도 없는 / 텅 빈 껍데기였음을
깨달음이라는 것도 / 함께라야 가능한 것
서로가 아니면 / 깨달음도 혼자 속에 /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것
함께라서 / 빈 껍데기의 깨달음도 / 소중한 토요일 오후
[‘날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 시집 중에서, 2019, 이상운 시인]
딸아이가 공부를 하러 떠났고, 안해마저 먼저 여행을 떠난 후, 나는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빈 둥지(empty nest)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 ‘빈 껍데기’라는 시어는 겸허히 인생을 사유하려는 자세이다. 앞만 보고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즐기려는 느린 템포의 삶이다. 삶의 느림은 흔히 지나치는 ‘든 자리’의 귀중함을 깨닫게 한다. ‘든 자리’에게 고마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든 자리를 모르니 난 자리가 더욱 서글프다.
필자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 지구 곳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감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마는 ‘난 자리’에 대한 애달픔이 전해오는 것만 같다. 필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형태, 과정, 그리고 기간만 다를 뿐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에서 애도와 슬픔의 고통을 다섯 단계로 말하고 있다. 부인 (denial), 화 (anger), 타협 (Bargaining), 우울 (depression) 그리고 수용 (acceptance) 들이다. ‘난 자리’의 슬픔과 애도는 요일, 계절, 년마다 서로 다른 단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한다. 문화마다 다르겠지만, ‘난 자리’를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걸, 하지 말걸, 더 해볼걸’ 등등.
며칠 전에 페북 친구가 적은 서평을 읽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저자는 호스피스 전담의로 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제일 많이 후회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이라고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든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든 자리’를 알아차릴 최적의 골든 타임이란 없다. 바로 오늘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최선의 기회이다. 만약 때를 놓치거나 무감각해지면 남은 것은 ‘철들자 망령이다’는 웃지 못할 단계가 기다린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오늘 읽게 되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 핸드폰을 들고 ‘든 자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후회할 일을 첩첩 쌓아놓고 살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 함께 하루라도 일찍 철들어 살기를 희망해 본다.
*이상운 시인은 가족치료 상담가로 활동하며, (시집) ‘광야 위에 서다 그리고 광야에게 묻다’, ‘날지 못한 새도 아름답다’가 있다.
본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