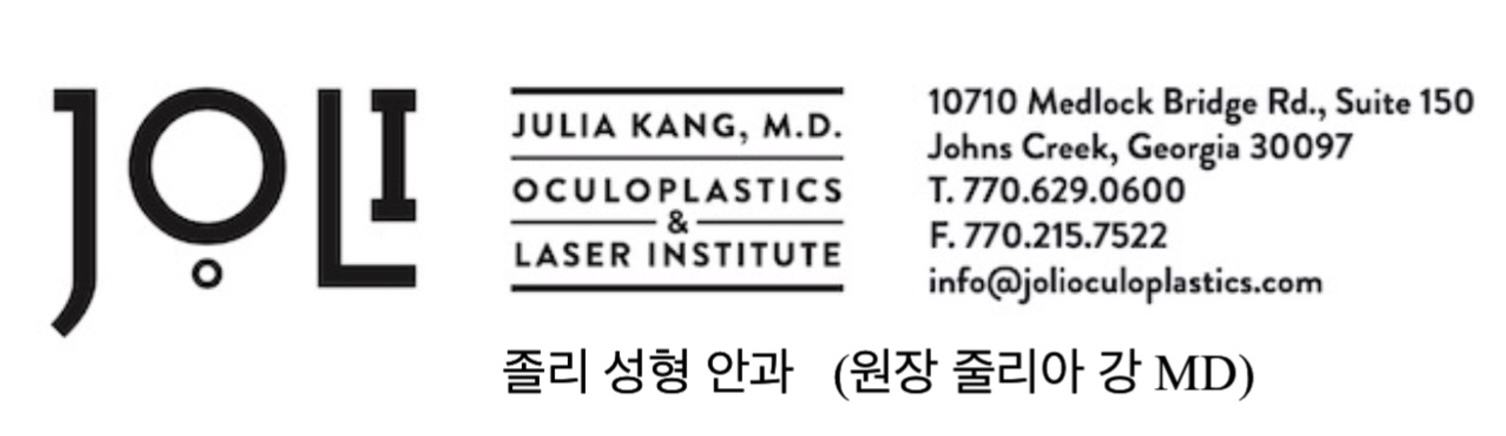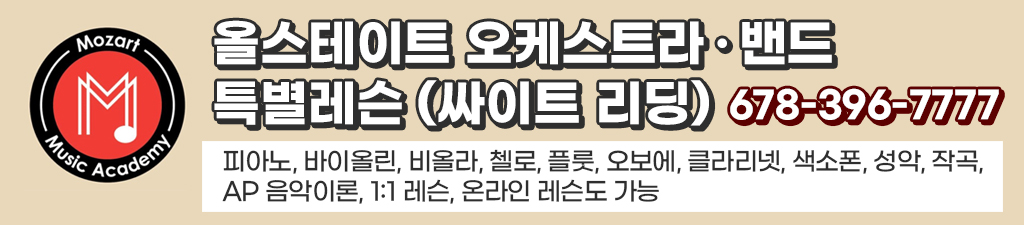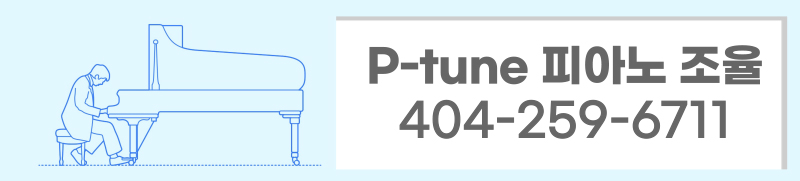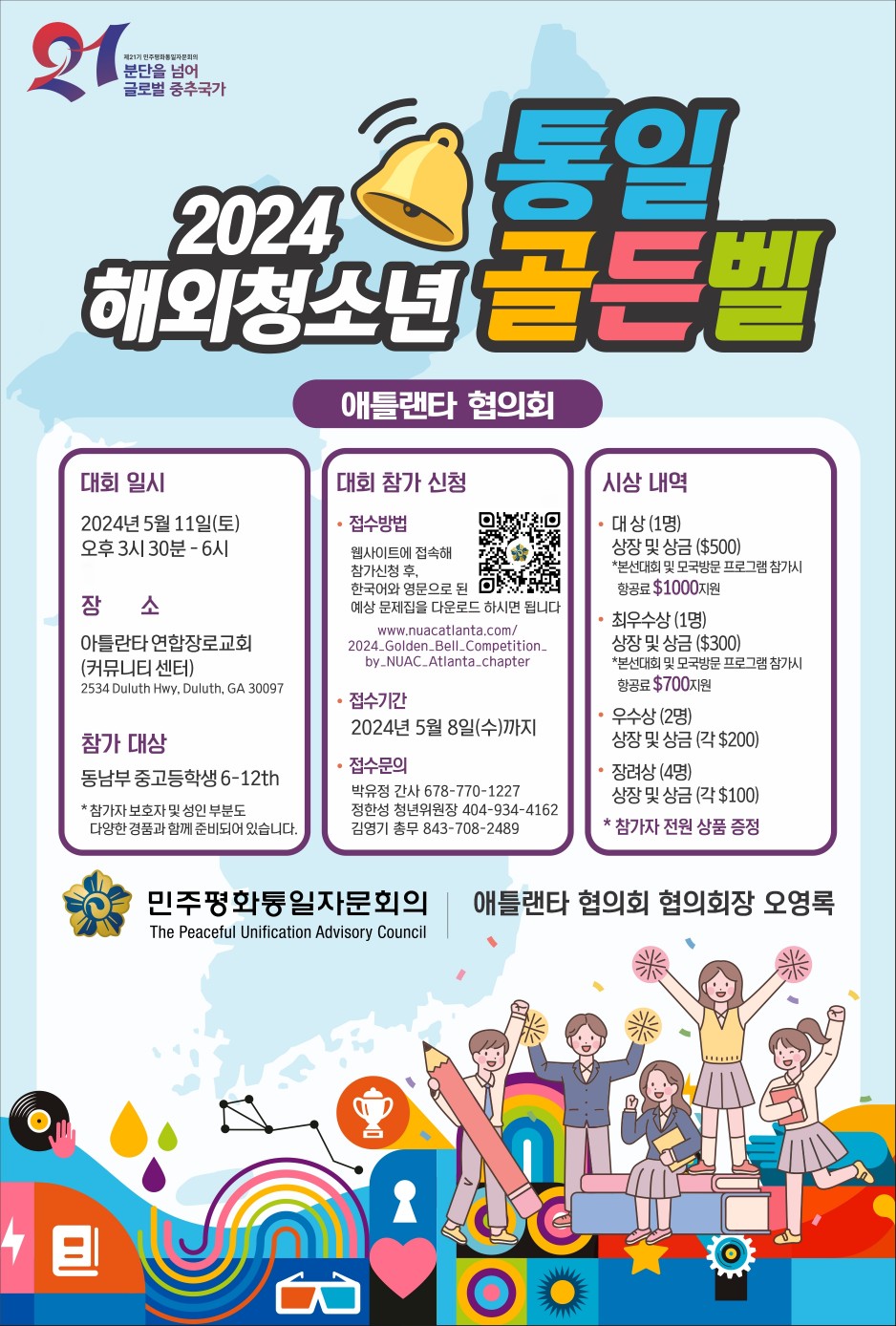김동식 – 전애틀랜타 한인문학회장
큰 딸 아이가 하루는 저녁을 먹으며, “아빠, 나 자전거 배우고 싶어.”라고 하였다.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이민 생활이 7년쯤 되었을 때였다.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전거를 내려다보지 말고 시선을 10미터 전방에 두라는 것이며,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기우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중심이 잡혀 넘어지지 않는다는 등, 몇 가지를 일러 주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되지 않았다. 열심히 자전거 뒤를 잡고 따라 다니며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게 쉽게 터득되질 않았다.
궁리 끝에 뒤에서 손을 놓고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꽉 잡고 따라가는 척했다.
그리고 몇 바퀴를 더 돌고 나서 잠시 쉬면서 실토를 했다. 그 말을 듣고는 아예 날 보고 따라오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였다. 혼자서 해 보겠다는 것이다.
몇 번을 더 넘어지면서도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 다시 자전거 뒤를 잡고 따라나섰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전거를 세우고 정색을 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빠, 아빠가 기본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연습하며 하나씩 익혀나가야 하는데 왜 자꾸 따라오려고 해요?” 무릎엔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도 기어이 저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딱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빨리 혼자서 잘 타게 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앞섰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난, “응 빨리 타게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내 말에 딸아이의 대답은 아주 뜻 밖이었다.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척척 잘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해 보면서 스스로 하나씩 익혀나가야지.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잘 타길 바라는 건 아빠의 욕심이야. 난 조금 다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익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난 아냐. 난 나 혼자서 좀 더 익혀야 해.”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잘 가르치는 것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학생은 가만있고 선생이 알아서 간을 딱 맞추어 먹을 만큼 떠서 학생의 입에다 넣어 주는 교육, 즉 일괄적인 주입식 교육에만 익숙해 있었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한 반에 학생 수가 60여 명이기에, 아예 다른 방법으로 가르칠 생각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만약 미국의 교육방법이 한국과 비슷한 주입식이었다면, 아마 딸 아이는 끝까지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 혼자서 해 보라고 내가 말 할 때까지, 제 혼자 해 보겠다는 생각은 아마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교육방법은 학생 자신이 판단하여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교육 환경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내겐 없었다.
아이들이 제 혼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 아이들이 제 혼자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영, 엉성하니 한심스러워 보일 게다.
그렇다고 부모나 보호자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어 버리면, 아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겨 독립심보다는 의존심이 심어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만 익숙해져 있던 내가 딸 아이게 내 뜻대로 가르치려 하다가 보기 좋게 당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